 야구에서 수비의 핵은 유격수다. 잡기 힘든 빠른 타구가 많고 송구 거리도 길어 수비 부담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유격수를 평가할 때는 화려한 묘기보다 어떤 공이든 편하게 잡는 안정감을 더 높이 친다. 역대 한국 야구 유격수 중 이종범 강정호 등 타격 귀재들을 제치고 통산 타율 0.261에 불과한 박진만을 최고로 꼽는 이유다.
야구에서 수비의 핵은 유격수다. 잡기 힘든 빠른 타구가 많고 송구 거리도 길어 수비 부담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유격수를 평가할 때는 화려한 묘기보다 어떤 공이든 편하게 잡는 안정감을 더 높이 친다. 역대 한국 야구 유격수 중 이종범 강정호 등 타격 귀재들을 제치고 통산 타율 0.261에 불과한 박진만을 최고로 꼽는 이유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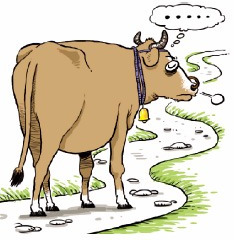 그러나 현실에선 대개 정반대다. 사람들은 ‘예방된 사고’를 과소평가하는 심리가 있다. 사고를 방치했어도 수습만 잘하면 칭찬받는다. 예방된 사고, 즉 예방을 잘해 터지지 않은 사고는 모르고 넘어가거나 평가에 인색하다. 4대강 사업이 여태껏 논란인 것도 녹조는 금방 눈에 띄지만 홍수 예방 효과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개 정반대다. 사람들은 ‘예방된 사고’를 과소평가하는 심리가 있다. 사고를 방치했어도 수습만 잘하면 칭찬받는다. 예방된 사고, 즉 예방을 잘해 터지지 않은 사고는 모르고 넘어가거나 평가에 인색하다. 4대강 사업이 여태껏 논란인 것도 녹조는 금방 눈에 띄지만 홍수 예방 효과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최근 구제역을 보는 언론의 관점에도 일종의 편향이 엿보인다. 소 구제역은 지난 4일 충북 보은, 전북 정읍에 이어 200㎞ 떨어진 경기 연천에서도 발생했다. 게다가 A형과 O형이 동시에 터졌다. 언론들은 ‘물백신’과 허술한 방역체계로 인해 전국 확산과 돼지 전염이 시간문제라고 대서특필했다. 보도대로면 벌써 난리가 나도 여러 번 났을 판이다.
그런데 마지막 발생일 이후 9일이 지나도록 의심신고가 없다. 방역당국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조심스레 안도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살처분 3314만마리, 피해액 1조원에다 계란 파동까지 빚었는데 구제역은 왜 이리 조용할까. 조기 신고와 적절한 방역 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이 후진적이라고 질타한 방역체계가 확산을 막고 있는 셈이다.
언론과 대중은 어떤 사고든 ‘예고된 인재(人災)’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야 비난 대상이 또렷해지고 비판도 쉽다. 천재지변이나 우연한 사고면 누굴 탓하겠나. 그러면서 예방과 방어 노력엔 무관심하다. 대신 사고가 났다 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후견지명이 넘쳐난다. 실제론 예상한 적 없지만 결과를 알고 나서 진작에 예견했다고 믿어버리는 ‘사후확신 편향(hindsight bias)’이다.
대형 사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 법칙(1:29:300법칙)’도 사후확신 편향에 가깝다. 산업재해로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의 경상자 29명과 다칠 뻔한 잠재적 부상자 300명이 있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진작 파악하고 대처했어야지 터진 뒤에 따져봐야 사후약방문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사후확신 편향을 드러냈다. 결과가 끔찍할수록 편향은 더 강해진다. 제 역할을 못 한 데 대한 자기 합리화 본능이 아닐까.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