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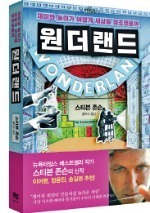
 ☞옆에서 소개한 사례는 미국의 과학저술가 스티븐 존슨의 책 《원더랜드》(프런티어 펴냄·444쪽·1만6000원)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인류 역사의 혁신이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한다. 패션, 쇼핑, 음악, 맛, 환영, 게임, 공공장소 등 여섯 주제로 나눠 즐거움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 상업화 시도와 신기술 개발, 시장 개척으로 이어진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옆에서 소개한 사례는 미국의 과학저술가 스티븐 존슨의 책 《원더랜드》(프런티어 펴냄·444쪽·1만6000원)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인류 역사의 혁신이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한다. 패션, 쇼핑, 음악, 맛, 환영, 게임, 공공장소 등 여섯 주제로 나눠 즐거움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 상업화 시도와 신기술 개발, 시장 개척으로 이어진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어느 초등학교 역사책이든 향신료 무역이 세계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세계무역, 제국주의, 콜롬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와 발견, 로마의 멸망, 주식회사, 베니스와 암스테르담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 이슬람교의 세계적 확산, 여러 풍미가 뒤섞인 도리토스의 맛까지 모두 향신료에서 비롯됐다. 인간이 향신료에 맛을 들였기에 오늘날의 세계가 존재하게 된 셈이기도 하다.
욕망과 환상의 사치품
지금 일상에서 값싸게 누릴 수 있는 향신료는 한때 말도 못하게 비싼 사치품이었다. 인간이 ‘그까짓 맛’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향신료 열풍이 일어난 이유는 기본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통상적인 해석이다. 고대 로마시대나 중세에는 겨우내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상하기 시작한 고기의 역겨운 맛을 덮기 위해 향신료를 썼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가설을 부정하는 논리도 있다. 후추나 육두구는 거금을 들여야 살 수 있었으므로 1600년대 가격 하락 전까지 유럽 상류층만 맛볼 수 있었다. 그런데 유럽 귀족에겐 신선한 고기나 생선이 동나는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향신료는 필수품이 아니라 갈망이었다.

중세시대 향신료는 ‘만병통치약’
중세 귀족들은 왜 향신료에 집착했을까. 당시 부잣집에 흔히 있었던 향미사(spicer)를 생각해 보자. 중세 향미사는 그저 음식 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약사’와 ‘라이프스타일 코치’의 중간 역할을 했다. 만성질환에서 수면 습관, 장 운동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자문했다. 여기서 향신료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개선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였다.
그 흔한 진통제나 항생제도 없던 시절, 바로 향신료가 약품 기능을 했다. 건강보조제로 오랫동안 쓰여온 후추는 암에서 치통,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다. 성기능 장애에도 향신료를 썼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향신료에 약효가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낭설이다. 하지만 향신료의 효능에 기본을 둔 이 ‘사이비 과학’은 당대 의학체계와 어깨를 겨뤘다. 그 낭설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는 처방전이 확립됐고, 건강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들을 발견하게 됐다. 엉터리 치료법을 알려주던 향미사는 오늘날의 약사와 제약회사의 전신인 셈이다.
신비로운 이국을 담은 맛
유럽인들이 향신료에 매료된 또 다른 미묘한 이유가 있다. 2000년 전에는 육두구, 계피, 후추를 섭취함으로써 지도상 머나먼 오지에 있는 신비로운 세상을 가장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유럽인들은 그 세계를 동양(the Orient)이라고 불렀다. 로마제국이 후추에 한창 열광하던 시기에는 인도를 정확히 그린 지도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정향의 생산지인 향신료군도는 로마인 가운데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니 이 음식들을 맛보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기분이 드는 게 당연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로 온 세상을 두루 섭렵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다. 세계에 뻗어있는 교역망을 통해 손에서 손으로, 극동 지역에서 로마제국의 연회장으로 전달된 씨앗과 열매와 식물 껍질이다.
유럽이 이토록 강렬하게 동양의 유혹에 이끌린 까닭은, 이 머나먼 곳이 말그대로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하는 문학작품들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타락한 문명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다. 향신료가 상당한 약효가 있다고 여겨지게 된 이유도 바로 원산지가 동양이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진화한 향신료
고추가 스페인에서 자생하고, 계피가 프랑스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며, 정향나무가 이탈리아에 즐비했다면? 인류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었을 것이다. 유럽은 훨씬 고립된 상태로 남고, 콜롬버스는 동쪽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굳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향신료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베니스와 암스테르담의 선구적 예술과 건축물도 없었을 것이다. 영국이 인도와 후추를 거래하지 않았다면 옥양목 천의 교역도, 그로 인한 면 섬유 시장의 부흥과 산업혁명도 한참 늦춰졌을지 모른다.
수많은 다른 형태의 쾌락이 그랬듯, 향신료에 맛들인 인간은 지리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자신의 뿌리를 벗어나 멀리까지 진출했다.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규정하는 경계를 확장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체험, 새로운 욕망, 새로운 맛을 향한 탐험의 욕구가 그 원동력인 경우가 많다. 그게 ‘사는 맛’ 아닐까.
정리=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