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엽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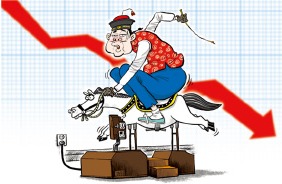 “2005년이나 2012년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다. 소련 경제는 회의주의자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폴 새뮤얼슨은 경제학 사상 최고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경제학》 서문에 이런 글을 적어넣었다. 서문을 쓴 시기는 소련이 해체되기 바로 전해인 1989년이다.
“2005년이나 2012년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다. 소련 경제는 회의주의자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폴 새뮤얼슨은 경제학 사상 최고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경제학》 서문에 이런 글을 적어넣었다. 서문을 쓴 시기는 소련이 해체되기 바로 전해인 1989년이다.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흐루시초프는 “수년 내 공업생산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다녔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뮤얼슨이 그런 허풍에 놀아난 것은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공산국가 특유의 허술하고 불투명한 통계가 부른 허상이었음은 소련 붕괴 후에야 드러났다.
흐루시초프에게서 힌트를 얻은 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 주석이었다. 그는 1958년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약진운동’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농업과 공업 생산력이 동시에 치솟았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하지만 거짓 보고였다. 대약진운동과 뒤이은 문화대혁명 역시 참극으로 막을 내렸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어쩌면 불가피한 길이었을 것이다. 덩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지 40년째인 지금 중국은 국내총생산(GDP)기준 세계 2위로 부상했다. 2000년대 초입의 10년간은 연평균 10%를 웃도는 초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G2’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하지만 소련 사례의 학습효과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 서방에서는 의구심을 담은 시선이 끊이지 않아왔다. 중국 성(省)정부가 집계한 지역내총생산(GRDP)을 합하면 항상 중국 전체 GDP보다 많은 점부터 의심스럽다. 부문별 성장률을 내지 않고 전체 성장률만 발표하는 것도 오해와 불신을 키운다.
중국 경제의 실체를 가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동원된다. 중국에 대한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와의 교역 규모까지 바로미터로 활용된다. 기차통행량 전기소비량 등을 연구해 보니 7.0%로 발표된 2016년 성장률이 실제로는 3.5%였다는 그럴싸한 분석도 나와 있다.
급기야 지난해 중국의 진짜 경제성장률이 1.67%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 산하 비밀 연구그룹의 추정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3분기까지 성장률 6.7%와 비교해 충격적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0%대”라고 단언하는 서방학자가 있었지만 중국 내부에서 나온 분석이라 주목을 더 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상상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이지만 시장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
힘을 앞세울 뿐 자유,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에서 할 말없는 중국이 맞닥뜨린 신뢰의 위기라 할 것이다. 중국 특유의 배금주의 성향도 사태를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시진핑이 2017년 10월 선언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여정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kecor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