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로 터뜨려 방출
[ 양병훈 기자 ]

부작용 억제는 항암제 연구개발(R&D)의 오랜 과제다. 이는 항암제를 표적 암세포에 정확히 전달하는 일과 관련이 깊다. 약물이 정상세포에 잘못 찾아가서 독성을 발휘하는 게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항암제 표적전달 기술은 주로 약물이 암세포 등 목표로 하는 지점의 특성을 인식해 반응하게 만드는 구조였다. 표적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약물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약물은 주로 혈관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정확한 표적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혈류는 초당 600㎜의 속도로 흐른다. 암세포 등 목표지점을 잠깐 스쳐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초음파를 이용한 약물전달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생겨 주목받고 있다. 초음파는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음파로 주파수가 20㎑를 초과하는 걸 말한다. 초음파는 거의 100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40년대 진단영역에서 처음 활용됐고 이후 물리치료, 담석제거, 절제 등 치료 영역에서도 쓰였다. 1990년대에는 항암 치료 영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흐름이 약물전달기술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초음파 약물전달기술은 물리적인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특정 지점에 능동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적이 아닌 곳에 전달되는 약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약물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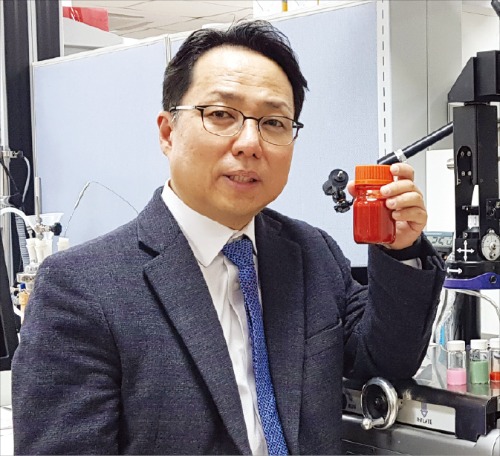
국내에서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대표 김철우)과 IMGT(대표 이학종) 두 곳이 초음파를 활용한 약물전달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두 기업이 개발 중인 기술의 공통점은 초음파를 쬐면 터지도록 설계된 인지질 미세기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미세기포를 혈관으로 주입한 뒤 표적 부위에 초음파를 쬔다. 그러면 미세기포가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표적부위를 지날 때 초음파를 만나 약물을 방출한다.
두 기업의 기술은 초음파를 쬐면 미세기포가 진동하다가 결국 터지는 공동화 현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미세기포를 두 겹으로 만들고 그중 안쪽 기포 안에 약물을 넣는다. 안쪽 기포는 초음파를 쬐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도록 설계돼 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기포가 표적 조직 속으로 파고든다. 초음파를 계속 쬐면 나중에는 기포가 터지면서 약물을 방출한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미세기포는 ‘저강도 집속형 초음파 장비’에 반응한다. 이 기술은 매우 작은 크기의 표적에도 비교적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초음파 의료기기 가운데서는 이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 표적전달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장비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 의료기기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장비를 개발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IMGT는 인지질 미세기포를 한 겹으로 만들고 바깥쪽에 약물을 붙인다. 미세기포가 표적 부위를 지날 때 초음파를 쬐 기포가 터지면 종양 세포막의 투과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약물이 종양 속으로 침투하기가 용이해진다. IMGT는 이 기술을 치매 같은 뇌질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뇌에 약물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혈뇌장벽(BBB)이 초음파를 받으면 열리기 때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관련뉴스














